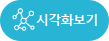| 항목 ID | GC40081675 |
|---|---|
| 한자 | - 不孝-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설화 |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배혜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서 지혜로운 부인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남편의 불효를 고친 아내」는 시아버지께 불효하는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지혜를 내어 남편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여성 지인담(智人談)이다.
1985년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현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 구비 문학 대계』7-14 달성군편에 실려 있다. 이는 1983년 9월 4일 달성군 화원면[현 화원읍] 설화리에서 조사자 최정여·박종섭·임갑랑 등이 김용암[남, 당시 59세]으로부터 채록한 것인데, 세찬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녹음에 방해가 되었다고 한다.
한 가정에 한 호불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있는데 참 그 며느리 거 착실한 분이라요. 이런데 그 어느 날은 그 분들의 시아버님은 어떻냐, 그 가정에서 아주 일도 잘 도우고 모든 손자도 잘 도우고 이런 분인데, 참 머 모든 그런데, 그 미느리 한 날은 시아바시 얼굴을 쳐다보이까 머리가 길었더랍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아야 되겠는데
"그래, 오늘 아버님 머리를 깎아이소."
"오냐, 깎지."
이라고 아들이 그날 출타를 하는데 그래 그 아버님 되는 사람이 아들한테
"야야, 오늘 내가 머리 좀 깎으로 돈을 쪼끔 도고."
이랜 기라요. 이라이까
"아이고, 내 바쁩니다. 뒤에 깎아이소."
이카고 그 출타를 했뿟어요. 했는데 미느리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으이까 말이지이 기가 찬다 이기라. 이래서 뒤쫓아 미느리 쫓아 나갔는 기라요. 나가서
"아이, 여보, 거 좀 있으소, 있으오."
이러이 말이지이 급히 쫓아 나가이께 그기 아들이 말이지이 서가 있드라 이기라. 자기 남편이 이럴 때,
"여보 나 오늘 돈 좀 주시오."
"뭐 할라카노?"
"내 오늘 말이지이 어데 볼 일이 있는데 어데 갈라카만 말이지이 난 머리를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고 이런 이얘기를 하이까
"그래."
카미, 주머니 돈을 쑥 빼 주거던. 그런데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시아바시,
"오늘 이발하이서."
이랬는기라. 그래 놓고 그날 참 이발을 떡 했는데, 그래 참 그 분이 출타를 해가지고 말이지 미칠 있다가 떡 둘이는 잘짜를 떡 그날은 말이지이 일부에 이 참 자기 부인이 그 미느리 말이지이 저녁을 안 묵고 자기 남편이 보는데 저녁을 안 먹었는 기라요. 안 묵고 떡 앉아 있으인께네 아가 말이지이 저녁 자기 아들이 묵는 걸
"임마, 너 저녁도 묵지 마라."
이라이까 미칠 출타했다 왔는 말이지,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점이 있다 말이라.
"왜 집에서 무슨 심장 상하는 일이 있었느냐?"
"머, 없지요. 당신이나 저녁 먹으라."
고. 그 눈치가 이상하고 이래서 말이라 아들이 물었는 기라. 물으이 남편이 저녁을 다 먹고나이 아들 뚜디라 팬다.
"너 겉은 놈은 죽어야 되지. 살아가 안 된다."
아를 뚜디라 패는 기라. 패기 시작하는데 그래 그 남편이 생각하니 '무슨 잘못을 해가 애가 저리 뚜디리 맞느냐' 싶어서 물었는 기라.
"아이, 당신 닮은 아 이런 거는 죽어야 된다. 자기 지집만 알고 말이야 자기 부모는 모르고 이것도 키워 노마 당신 닮아서 말이징. 이런 행동을 할 낀데 이걸 키와가 뭐 할끼냐고. 앞으로 키워봐라. 마, 당신 우리 아바님만치 나 많애서 말이지이 머리 깎알라카마 안 주고 자기 지집은 말이지이 머리 단속 할라카마 돈 줄낀데 이것 놔도 뭐 할끼냐꼬. 이거 죽있뿌고 우리 차라리 이거 없이 사는 기 편타 말이라."
말했는 기라. 하이께네 이거 저거 남자가 가마 생각하이 말이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그 자기 부인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안 하겠다. 용서해 도고."
이라미, 그 남자의 거 뭐 그거 남자가 불효자식은 아닌데, 우리가 참 무안정에 바뿌고 하면은 그러한 말이지이. 사람이 이 동네에도 불효가 아이더라도 그것을 딱 곤치서 그 남편을 옳은 사람을 만들더라 카는 이런 이애깁니다.
「남편의 불효를 고친 아내」의 주요 모티프는 '지혜로운 여성의 문제 해결'이다. 불효한 남편의 행동을 지혜로 바로잡는다는 「남편 불효를 고친 아내」는 큰 틀에서 여성 지인담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또한, 「남편의 불효를 고친 아내」는 같은 마을에서 전승되는 「맏동서의 지혜로 화목해진 김씨네」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며느리 설화라고도 할 수 있다. 「맏동서의 지혜로 화목해진 김씨네」에 비하면 작은 사건 하나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아버지를 향한 남편의 잘못된 행실을 두고 보지 못하고 지혜롭게 꾀를 내어 남편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측면에서 여성[며느리]이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불효라는 잘못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편하다.'는 옛말을 잘 보여 주는 며느리 설화로 볼 수 있다.
- 『한국구비문학대계』 7-14 달성군 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