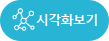| 항목 ID | GC03302005 |
|---|---|
| 한자 | 水沒-淸風-火田-記憶-長善 |
| 영어의미역 | 12 Villages that Preserve Old Memories of Submerged Cheongpung and Slash-and-Burn Fields |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이정화 |
[개설]
장선리는 이웃 마을 부산리와 함께 1985년 충주댐을 건설할 때 수몰되지 않은 청풍면의 유일한 2개 마을 중 하나이다. 장선리가 수몰되지 않은 건 높은 산간 지대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산간 지대에 자리한 마을들이 으레 그러듯 장선리 또한 화전(火田)으로 터전을 일구며 살았다. 장선리 사람들의 기억에는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척박한 기억과 함께 충주댐 수몰로 인하여 사라진 청풍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국사봉(國師峰) 산허리를 따라 구불구불 난 길을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장선리는 제천 지역 중에서도 산간벽촌으로 알려져 있다. 장선리를 찾아가기 위해 단양 방면 지방도 82호선을 달리다 보면 남제천 IC를 만나게 된다. 남제천 IC를 지나면 이어서 금성면 소재지에 다다른다. 금성면 소재지가 있는 구룡리에서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진리, 사곡리, 활산리를 지나면 국사봉이 나온다. 이때 국사봉을 끼고 조금 더 달리다 보면 국사봉 가파른 골짜기로 둘러싸인 장선리에 이른다.
장선리는 북쪽으로 마미산(馬尾山)과 국사봉, 남쪽으로 면위산(免危山)이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동쪽으론 수름산이 자리하고, 마을의 서쪽으론 충주시 산척면 방대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장선리는 전형적인 산전(山田) 마을로, 마미산과 국사봉, 면위산의 골짜기를 따라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마을에서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차례대로 부산리와 후산리, 황석리에 이르고, 그 앞으로 푸르른 청풍호가 시야를 가득 메운다.
장선리는 청풍면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제천군 수하면에 편입되었다가 1929년 청풍면에 편입되었다. 1980년에는 제천군이 시로 승격되자 제원군 청풍면 장선리가 되었고,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가 되었다.
마을이 긴 골짜기 안에 형성되었다고 해서 ‘장선(長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국사봉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마을이 모두 12곳이라고 하여 ‘열두 장선’이라고도 부른다. 골짜기마다 마을이 들어앉아 큰 산이 성처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요새와 같다고 하여 예전 어른들은 ‘장성(長城)’이 변하여 장선이 되었다고도 했다. 마을에 제일 처음 들어와서 자리 잡은 성씨는 강릉 유씨(江陵劉氏)이다.
[열두 골짜기마다 이름이 있고 유래가 있는 곳]
‘열두 장선’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장선리는 옛날부터 12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은 12개의 자연 마을 중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은 총 4개 반 9개 마을이다. 1반은 뽕나무거리와 어리실로 이루어졌고, 2반은 가산절이다. 3반은 지통골·줄병골[출병골]·달랑고개[월령], 4반은 가느실·지당골·산저터로 이루어져 있다.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1970년대 이전에는 삭사골, 마산, 지삐기, 올감나무골, 낙타골, 짝고라니, 상사골 등의 마을에도 사람들이 살아서, 100여 호가 골짜기마다 둥지를 틀고 있었다.
마을 회관과 노인정이 있는 가산절은 장선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가산절이라 부르게 된 유래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현재의 가산절이 있는 곳에 ‘가산’이라 불린 절이 있어 ‘가산절’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 유우상에 의하면, 예전에 새로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집터에서 토기와를 구운 흔적뿐만 아니라 절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샘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뽕나무거리는 ‘뽕나무 상(桑)’ 자를 써서 ‘상거리’라고도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 뽕나무가 많아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 같다고 한다. 어리실은 본래 ‘어의곡(於義谷)’·‘어리곡(於里谷)’이라고 불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의굴’·‘어리굴’이라고 부르다가 어리실로 바뀌었다. 어리실은 풍수지리적으로 배 형국(形局)을 하고 있다.
지통골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과거 마을에 한지를 생산하던 지소(紙所)가 있어서 ‘지소’로 불리다가 언제부턴가 ‘지통’이란 이름으로 변해 지통골이 되었다고 한다.
줄병골은 마을 뒤편에 병풍을 두른 것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줄병풍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혹은 바위의 형상이 마치 군사가 출병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출병(出兵)’이라 부르다가 줄병골이 되었다는 말도 있다. 줄병풍바위는 모양이 일자로 생겼다. 꼭대기 위에 있는 바위는 아기 모양을 닮아 ‘애기바위’라 부르고, 그 중간에는 병풍같이 생긴 바위라고 하여 ‘병풍바위’라고 한다. 끝에 있는 바위는 ‘밀바위’라 부른다. 밀바위 밑에는 굴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달랑고개는 1960년대 말까지 10가구가 살았으나 현재는 5가구가 살고 있다. 달랑고개는 ‘달 월(月)’에 ‘고개 령(嶺)’ 자를 써서 월령이라고도 부르는데, 풍수지리상 풀무의 모양을 하고 있다. 풀무는 발로 밟아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인데,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예부터 터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고갯마루와 고갯마루가 모여 장성을 이루다]
장선리는 열두 골짜기 이외에도 마을을 장성같이 감싸고 있는 고갯마루들의 이름도 많다. 마미산과 국사봉 줄기를 따라 고갯마루와 고갯마루가 모여 있는 장선리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인민군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다. 큰길로만 다녔던 인민군들의 눈에 고개를 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발길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장성같이 감싸고 있는 고갯마루들은 장선리 사람들이 외부로 통하는 소통로의 구실도 했지만, 화전(火田)을 일구며 살던 시절에는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 장선리 앞을 지나는 큰 도로는 과거 조그맣게 나 있던 길을 깨끗하게 포장만 했을 뿐이다. 과거에는 이런 길 이외에 장선리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고갯마루와 고갯마루를 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장선리에서 이웃 마을 활산리로 가기 위해서는 ‘도둑놈’이라 불린 고개를 걸어서 넘었다. 과거 청풍이 물에 잠기기 전, 장선리에서 청풍으로 가기 위해서는 15리 길을 걸어 황석리로 가서 찻배를 타고 건너다녔다. 찻배는 나룻배 형태로 차도 같이 실어 나른다고 하여 불리던 이름이다. 이때 황석리까지는 ‘밭치재’로 걸어 다녔다. 또한 어리실에서 봉양읍 구곡리를 가기 위해서는 ‘새미기’를 넘어 다녔다. 줄병골에서 봉양읍 소재지로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서울재’로 넘어 다녔다. 새미기와 서울재는 장선리 사람들이 주로 화전을 일굴 때 가장 많이 찾던 고갯마루들이었다.
줄병골에서 봉양읍 공전리로 가기 위해서는 ‘서리목’을 넘어 다녔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버스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제천장을 보기 위해 제천 시내로 갈 때는 공전리까지 걸어서 간 후에 공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제천 시내로 갔다.
달랑고개에서 ‘잿고개’를 넘어가면 바로 충주시 산척면 방대리로 이어진다. 잿고개에 서면 달랑고개를 시작으로 장선리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높은 언덕배기이다. 이 언덕배기 길은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석양이 질 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힌다. 그래서 석양이 지는 잿고갯길을 찍기 위해 지금도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잿고갯길은 장선리 큰길과 연결되어 있어 지금은 깨끗하게 포장된 2차 도로 길이 되었다.
[아스라한 청풍의 옛 기억들]
장선리에서 부산리를 거치면 후산리와 황석리 앞으로 호젓한 청풍호가 눈에 들어온다. 바다같이 넓은 호수를 옆에 끼고 산허리를 굽이굽이 돌아가면 깎아지른 절벽이 그 위용을 자랑한다.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경(秘境)을 만난 기분이다.
1985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제천 지역 5개 면 61개 마을이 수몰되었다. 황석리의 경우 예전 마을은 수몰되어, 마을 사람들이 지금의 위치로 올라와 다시 터전을 잡은 것이다. 장선리 사람들은 높은 산간 지대에 마을이 있어서 물속으로 수몰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거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시절 제천장까지는 걸어서 40리, 청풍장까지는 20리였다. 생활권이 청풍이었던 장선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충주댐으로 인해 사라져 버린 청풍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은 물에 잠겨 버린 청풍의 나루터는 예전에 소금을 비롯한 각종 해산물과 비누, 석유, 성냥 등 농가의 필수품과 무, 배추, 땅콩, 고추, 담배 등이 거래되던 장터였다. 특히 나루터에서는 제천을 거쳐 멀리 강원도 산골로 물건을 사고팔러 가는 봇짐장수들이 줄을 지었다. 청풍 봇짐장수는 인근 지역에서도 명성을 떨쳤다고 한다. 이와 함께 청풍장 또한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충주댐 담수는 한번에 차오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진행되었다. 수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장선리 사람들은 자주 청풍장을 보러 다녔다. 수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선리에서 청풍을 가기 위해서는 황석리에 가서 찻배를 타고 청풍으로 건너 다녔다.
황석리에서 찻배를 타고 청풍 나루터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을 반긴 것은 보물 제528호로 지정된 한벽루(寒碧樓)였다. 한벽루 누각의 다리 사이를 지나면 청풍면 소재지가 한눈에 보이고, 그 사이로 어렴풋이 청풍장 또한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찻배로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청풍장 또한 장선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게 되었다.
[청풍이 수몰되면서 없어져 버린 장선분교 이름]
가산절에는 지금은 폐교가 되어 버린 학교 건물 한 채가 있다. 학교 이름을 적은 문패도 없어진 채 무성한 잡초만이 가득한 학교 운동장에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으리라. 마을에는 이 폐교와 관련하여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1940년대 장선리 사람들은 황석리에 있는 황석국민학교를 다녔다. 당시 장선리에서 황석리까지는 걸어서 15리 거리였다. 15리 거리를 아이들이 걸어 다닌다고 상상해 보라. 장성한 어른도 힘든 거리를 아이들이 걸어 다니기엔 무리가 있었다. 마을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있었다. 당시 지통골에 살았던 최성한으로, 마을에 학교가 있으면 아이들이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살던 집터와 집을 마을 사람들에게 학교 건물로 쓰게 해 달라고 희사하였다. 자신이 살던 집을 학교 건물로 내어준 것이다. 이에 제천교육청에서 ‘황석국민학교 장선분교’로 허가를 내주었다. 장선분교에는 장선리 이외에도 부산리와 사오리에 사는 아이들도 다녔다.
하지만 몇 해 지나 수해로 인해 최성한이 희사한 학교 건물이 물에 휩쓸렸다. 최성한의 갸륵한 뜻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장선리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갹출하여 지금의 가산절 옆 대지를 구입하여 학교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했고, 이를 알게 된 교육청에서 학교 건물 공사비를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지금은 폐교가 되어 버린 학교 건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희사하여 다시 세운 거나 다름없던 장선분교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황석국민학교가 수몰되면서 ‘금성국민학교 장선분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후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1996년 지금의 금성면 소재지에 있는 금성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수몰된 청풍과 함께 장선분교의 이름 또한 없어지고, 이제는 낡은 건물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화전을 일구며 살아온 장선]
현재 장선리를 이루고 있는 9개의 자연 마을은 각각 국사봉과 마미산, 면위산의 골짜기를 따라 자리를 잡고 있다. 먼저 뽕나무거리와 어리실, 가산절은 국사봉의 골짜기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줄병골과 지통골, 달랑고개는 마미산의 골짜기를 따라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느실, 지당골, 산저터는 면위산의 골짜기를 따라 둥지를 틀고 있다.
큰 산의 줄기를 따라 산간 지대에 형성된 장선리는 과거 제천의 여느 지역처럼 화전을 일구며 살았다. 장선리에서 주로 화전을 일구었던 곳은 봉양읍 구곡리를 가기 위해 넘어 다녔던 ‘새미기’, 줄병골에서 봉양읍으로 가기 위해 넘어 다녔던 ‘서울재’와 ‘붉은디기’이다. 대개 고갯마루를 중심으로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것이다. 장선리가 화전으로 주로 농사를 지었던 시기는 1945년 광복이 되기 전부터 1970년대 후반 정부가 화전 정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였다.
화전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농사지을 땅을 정하고, 겨울쯤 나무나 풀을 베어 두었다가 다음 해 봄 불을 놓아 땅을 일구는 것이 보통이었다. 벌채를 할 때 큰 나무는 톱으로 베고 작은 나무는 낫을 이용하여 깎았다. 이후 4월쯤 벌채하여 쌓아 두었던 풀이나 나무에 불을 놓는다. 이때 불을 피우는 것을 ‘불짓 돌린다’라고 한다.
불은 주로 야간에 피웠다. 낮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어 불길이 사방으로 번질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불은 산의 위쪽에서 먼저 놓아 불길을 아래로 유도하여 내려오게 하였다. 불이 다 타면 잔가지가 붙은 나무들은 완전하게 다 타는 반면, ‘부대나무’라고 하여 큰 나무는 몸통은 타지 않고 잔가지만 탄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한 번 더 태웠다.
불을 놓고 다 타고 재가 남으면, 그 자리를 잠시 묵혀 두었다가 괭이로 땅을 뒤집는다. 괭이로 땅을 뒤집을 때는 산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골고루 헤집어 준다. 화전을 일굴 때는 괭이로 파기도 하지만 소를 몰아서 갈기도 하였다. 인근 강원도 지역이 소 두 마리가 끄는 ‘겨리소’를 모는 한편, 제천은 소 한 마리를 몰았다. 산의 경사가 급하고 아주 험한 곳은 소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땅을 일구었다.
화전은 밭을 일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 밭을 일구기만 하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갈아서 준비해 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가 담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소 외양간을 부엌 건너편에 두었다. 외양간에 있는 소가 부엌에서 주부가 밥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야 잘 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땅을 뒤집고 나면 초목의 재를 거름 삼아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서슥’[서숙, 조]의 씨앗을 뿌린다. 서숙의 씨는 한 되 정도 뿌리면 1년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둘째 해에는 콩으로 하고, 다시 세 번째 해에는 서숙 농사로 돌아온다. 대개 음력 7월쯤에는 메밀 농사도 병행하였다. 여름내 우거졌던 풀들이 힘을 잃고 쓰러져 있으면 대개 이 풀들을 태워 거름으로 사용하여 메밀 농사를 지었다. 메밀은 씨를 뿌리고 50일이 지나면 바로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울력으로 지은 화전 농사]
봄에 뿌린 씨가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 작업을 했다. 김매기는 호미를 사용해서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전을 일굴 때는 자라 올라온 잡풀을 베어 주거나 맨손으로 솎아 주기만 했다. 이렇게 잡풀을 뿌리째 뽑지 않고 베어 주거나 손으로 솎아 주기만 하는 것은 잡풀 자체를 거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매기는 모두 세 번을 해 주는데, 세벌김은 7월 이전에 모두 끝낸다. 즉, 첫 번째의 ‘아이김’은 씨를 뿌리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매며, 두벌김은 다시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나서 맨다. 그리고 다시 10일이 지나면 마지막 세벌김을 맨다. 이렇게 세벌김은 7월 호미씻이를 전후로 한 달 안에 끝이 난다.
화전을 일구던 시절에는 7월쯤이면 1년치 농사가 반 이상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한가한 시기였다. 김매기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7월이면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가한 시기이므로 내년에 지을 화전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산을 위하는 ‘산고사’를 지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가을이 되어 9~10월에 서숙을 수확할 시기가 다가오면 서숙을 베어 ‘곡식가리’, ‘줄 가지’를 쳐 둔다. 그리고 이것이 다 마를 때까지 한 달 정도 두었다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 타작을 한다. 타작을 할 때는 동네 사람을 불러 ‘울력’을 져서 함께 공동 작업을 한다. 울력은 품앗이와 비슷한 노동 형태이다. 다만, 품앗이가 1 대 1로 교환하는 노동력인 데 반해 울력은 1 대 다수로 교환하는 노동력으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 일을 끝내는 형태이다. 울력을 지는 단위는 자기가 사는 골짜기 안의 ‘소동(小洞)’ 사람들이다.
과거 화전민은 개간할 땅이 정해지면 터를 잡고 집을 짓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평야 지대의 마을처럼 여러 집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하는 것은 드물다. 평지 마을과 달리 장선리는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과거 화전민의 관행과 같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집들이 있던 모습을 지금도 발견할 수 있다. 보통 골짜기를 중심으로 두세 집씩 모여 살았기 때문에 골짜기 마을 단위로 ‘반갈이’[반계] 관행이 지금도 남아 있다. 같은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을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서낭당 또한 골마다 있었기 때문에 주로 서낭제를 지내게 될 때 제관 결정을 의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는 이사를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반갈이를 할 때 ‘입계금’이라고 하여 콩 한 말을 내주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모두 모여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놀았다.
[마을 운영 기금으로 쓰인 ‘산세’]
가을철이 되면 각 농가마다 화전에 대한 도지(賭地)를 매기는데, 이를 ‘화숙매기’[화식매기(火食매기)]라고 한다. 화숙매기는 쉽게 말하면 ‘산세’라고 하여 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화숙매기는 동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화전을 직접 돌아다니며 ‘산세’를 정한다. 장선리에서 화전을 일구었던 산들은 대개 군유림(郡有林)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동네 이장이 함께 돌아다니며 화숙매기를 했다.
이때 산세는 화전의 면적과 작황을 참작하여 액수가 결정되었다. 보통 화전의 면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산세는 곡식으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겨진 산세는 가을걷이를 마친 뒤 동계가 열리는 날 수합하여 마을의 운영 경비로도 사용되고, 동계에 예치했다가 원하는 주민들에게 ‘장례쌀’[장리(長利)]을 놓아 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동 기금으로도 활용하였다.
[천지 사방에서 자란 산나물이 식량]
장선리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시기에는 산나물을 많이 먹고 살았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산을 일구고 살면서 산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선리에서 산나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은 마미산과 면위산, 국사봉 줄기이다. 특히, 장선리의 산나물은 봄이면 야산으로 산나물을 캐러 다니는 산나물꾼들 사이에 그 종류가 많기로 유명하다.
봄은 그야말로 ‘나물의 계절’이다.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물의 종류도 달랐다. 주로 이른 봄에는 나생이[냉이]와 달롱이[달래], 지창구나 지친개로 불리는 지칭개가 많이 나고, 4월쯤 되면 나물취, 햇잎, 원추리가 난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두릅과 고사리가 난다. 이외에도 봄에는 질경이, 꽃다지, 쌉줄싹, 잔디싹 등의 나물들도 난다. 여름이 되면 나물의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대개 여름 전까지 나물을 많이 먹었다.
또한 나물은 채취 장소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야산에서는 햇잎·원추리·‘꼬들빼기’[고들빼기]가 나고, 깊은 산에서는 참나물·‘며느리취’[금낭화]·곰취·모싯대 등이 난다. 나물 중에는 식용으로 먹는 나물도 있었지만, 약용 나물로 먹는 나물도 있다. 잔대, 삽주싹, 홑잎의 줄기는 약용의 목적으로 먹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고사리와 비슷하게 생긴 고비나물, 고들빼기보다 작은 속새와 나물취, 떡취 등의 여러 나물들이 난다. 화전을 일구며 살던 시기에는 ‘묵나물’을 해서 나물을 보관했다. 여름 전까지 틈틈이 산과 들로 다니며 나물을 부지런히 뜯어 모아 데쳐서 말린 것을 묵나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묵나물을 해 두면 여름, 가을, 겨울에도 나물을 먹을 수 있었다.
[먹고살기 위해 짓던 농사에서 사고팔기 위해 짓는 농사로]
화전과 함께 지난날 장선리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것은 닥나무를 이용한 한지(韓紙) 뜨는 일이었다. 봄과 가을에는 화전 농사를 하고, 가을부터 한지를 뜨기 위한 준비를 한다. 닥나무의 닥을 긁어 두었다가, 따뜻해지는 초봄이면 이 닥을 잿물에 넣고 삶아 한지를 떠낸다. 이렇게 뜬 한지는 제천 도매상에게 넘기거나, 충주 목계나루의 내천장으로 걸빵짐을 꾸려 가지고 가서 팔기도 하였다. 인근 부산리 또한 장선리와 같이 화전 농사와 한지 뜨는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장선리에 닥나무가 더 많이 있어서 종이 공장이 더 많았다.
화전 농사와 한지 만드는 일을 한동안 병행하던 장선리 사람들은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화전 정리 계획으로 화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화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100여 호가 살았던 장선리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딱히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상황에서 담배 농사는 장선리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당시 담배 농사는 전매청과의 계약을 통해 선자금을 받고 재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담배 농사를 통해 장선리 사람들 모두 환금 작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때는 장선리 사람 모두가 담배 농사를 지었을 정도로 담배는 인기 품목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지금은 담배 농사를 하는 집이 몇 집 남아 있지 않다. 담배 농사가 힘든 것은, 더운 여름 땡볕이 쏟아지는 밭에서 잎담배를 수확하고, 잎담배를 말리기 위해 벌크에 넣을 때의 과정 때문이다.
1970년대 말부터 담배 농사와 같은 환금 작물로 고추 농사를 시작했으나, 고추 농사 역시 마을 사람들이 고령화되면서 요즘은 몇 집밖에 짓고 있지 않다. 고추를 따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펴는 것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은 마을 사람 대부분이 콩이나 깨, 팥, 고추 정도를 집에서 먹을 만큼만 짓고 있다.
- 『제천마을지』-금성·청풍·수산·덕산·한수면편(제천문화원, 1999)
- 『제천시지』(제천시지편찬위원회, 2004)
- 주영하·전성현·강재석, 『한국의 시장』-사라져가는 우리의 오일장을 찾아서(공간미디어, 2007)
- 김진순, 「강원도 민속의 지역적 정체성: 산간민속을 중심으로」(『비교민속학』29, 비교민속학회, 2005)
- 강성복, 「제천시 화전촌 동제의 전승양상과 그 특징: 청풍면 부산리」(『충북학』9, 충북개발연구원, 2007)
- 박선미, 「산골마을 사람들의 산나물 채취와 식용의 전승지식: 경북 안동시 풍산읍 서미1리를 중심으로」(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제천시청(http://www.okjc.net/)
- 인터뷰(장선리 주민 안병도, 남, 79세, 2011. 2. 12)
- 인터뷰(장선리 주민 이복희, 여, 75세, 2011. 2. 12)
- 인터뷰(장선리 주민 도종락, 남, 74세, 2011. 2. 12)
- 인터뷰(장선리 주민 김봉영, 남, 73세, 2011. 2. 12)
- 인터뷰(장선리 주민 유철상, 남, 72세, 2011. 2. 12)
- 인터뷰(장선리 주민 황윤관, 남, 71세, 2011. 2. 12)
- 인터뷰(장선리 주민 유필상, 여, 70세, 2011. 2. 12)
- 인터뷰(장선리 주민 이복희, 여, 63세, 2011. 2. 12)
- 인터뷰(장선리 주민 이경애, 여, 77세, 2011. 4. 3)
- 인터뷰(장선리 주민 조우현, 남, 73세, 2011. 4. 3)
- 인터뷰(장선리 주민 박종순, 여, 71세, 2011. 4. 3)
- 인터뷰(장선리 주민 유옥녀, 여, 69세, 2011. 4. 3)
- 인터뷰(장선리 주민 엄차용, 남, 58세, 2011. 4. 3)
- 인터뷰(장선리 주민 전연화, 여, 57세, 2011. 4. 3)
- 인터뷰(장선리 주민 김창률, 남, 52세, 2011. 4. 3)
- 인터뷰(장선리 주민 강인순, 여, 67세, 201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