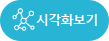| 항목 ID | GC03301604 |
|---|---|
| 한자 | 務道里-祭 |
| 영어음역 | Mudo-ri Eumjimanjisil Sugumagije |
| 영어의미역 | Eumjimanjisil Village Ritual in Mudo-ri |
| 이칭/별칭 | 무도리 공알바위,무도리 배꼽바위,무도리 용암 |
| 분야 | 생활·민속/민속,문화유산/무형 유산 |
| 유형 | 의례/제 |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음지만지실 |
| 시대 | 현대/현대 |
| 집필자 | 이상희 |
| 의례 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음지만지실 |
|---|---|
| 성격 | 마을 신앙 |
| 의례 시기/일시 | 음력 1월 2일 |
| 신당/신체 | 독바위[남근석]|공알바위[용암] |
[정의]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음지만지실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며 지내던 마을 제사.
[개설]
무도리 음지만지실 수구막이제는 남서낭에 해당되는 독바위[남근석]와 여서낭에 해당하는 공알바위[배꼽바위, 용암]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이튿날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이를 무도리 공알바위, 무도리 배꼽바위, 무도리 용암 등이라고도 한다. 특히 공알바위는 제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신앙의 형상이다.
[연원 및 변천]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용암마을에는 독바위[할아버지 서낭]에서 돌을 던져 건너편에 있는 공알바위[할머니 서낭]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기자속(祈子俗)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기자속이 의례화가 된 것이 수구막이제이다. 남서낭에 해당하는 독바위에서 제를 올린 후 여서낭에 해당하는 공알바위에서 제를 지내는 순서로 기자속이 반영되어 있다.
원래 있던 독바위는 수로(水路)가 나면서 드러나 버려서, 그 옆에 새로 생긴 작은 바위를 할아버지당 대신으로 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에 서낭당이 있어 서낭당에도 제사를 지냈으나 미군이 마을에 들어와 서낭당을 부순 후부터 서낭제는 중단되었다.
[신당/신체의 형태]
용암마을로 들어서는 옛길의 입구에 있는 사람 배꼽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를 배꼽바위 또는 공알바위라고 부른다. 공알바위 건너편에 남근석에 해당하는 독바위가 있다. 공알바위와 독바위의 거리는 약 20m정도이다. 배꼽바위의 위치가 용의 눈과 같다고 하여 용암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옆에 세운 비석에도 용암이라고 새겼다.
[절차]
매년 설날 이후 그해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가려 제관 3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사람들은 금줄을 만들어 치고 제사 준비를 한다. 초이튿날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초삼일 새벽 한 시쯤 제가 마무리된다. 먼저 할아버지당[독바위]에 제를 올리고 난 다음 할머니당[공알바위, 배꼽바위]에서 제사를 올린다. 제사를 지낼 때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 제수는 삼색실과와 떡, 북어포 등 유교식 제수와 비슷하고, 제사 절차도 약식화된 유교 기제사 순서와 별 차이 없이 진행된다. 축문은 제사 끝에 태운다.
[축문]
축문의 내용은 물이 마르지 않고, 마을에 괴질이 생기지 않고, 왕박산의 호랑이가 내려와 사람을 해치지 않게 하며,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천 마을지』-금성·청풍·수산·덕산·한수면편(제천문화원, 1999)
- 『문화유적분포지도』-제천시(충북대학교 박물관, 2003)
- 『제천시지』(제천시지편찬위원회, 2004)